TECH M
TECH M
혁신해야 사는 기업, 혁신을 거부하는 소비자


| (애플과 LG는 각각 ‘3D 터치’(위)와 ‘프렌즈’(아래)로 혁신성을 선보였지만, 이러한 혁신적인 비정렬 특성보다는 정렬 가능한 특성(디자인, 화소, 액정 크기 등)이 소비자의 구매 의사결정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
글 = 연세대 UX랩 인지공학스퀘어(한지훈, 조광수)
새로운 스마트폰이 가진 특별한 기능은 무엇이 있는가? 애플의 ‘아이폰6S’라면 ‘3D 터치’ 기술로 다양한 인터랙션(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 삼성의 ‘갤럭시 S7’이라면 엣지 태스크 기능이나 방수 기능이 있다. LG의 ‘G5’는 ‘프렌즈’라고 하는 모듈 방식의 다양한 액세서리를 사용해 광각렌즈나 망원렌즈, 고음질 오디오 등을 스마트폰에 탈부착할 수 있다.
이런 혁신적인 특성은 모든 상품에 존재하지 않고 특정 상품에만 존재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렇게 상품 간의 비교에서 한 상품에는 있지만 다른 상품에는 없어서 ‘있고, 없고’로 비교할 수 있는 특성을 인지심리학의 구조정렬모형(structure alignment theory)에서는 비정렬 특성(nonalignable property)이라고 한다. 비정렬 특성은 한 상품에만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기준을 갖고 비교할 수 없다.
그렇다면 소위 혁신이라고 불리는 비정렬 특성이 소비자가 스마트폰을 선택하는 데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비슷한 가격대의 스마트폰을 비교하고 구매한다고 가정했을 때, 3D 터치 기능, 엣지 태스크 기능, 혹은 프렌즈가 과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지 생각해보기 바란다. 사람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상품의 차별적이고 혁신적인 특성보다는 오히려 베젤의 디자인, 카메라의 화소, 액정의 크기, 혹은 배터리의 용량 등을 더 중요하게 고려할 수 있다.
이처럼 비교 대상들이 특성을 모두 갖고 있지만 그 수준에서 차이가 있어 같은 기준으로 비교가 가능한 상품을 정렬 가능한 특성(alignable property)이라고 부른다.
위의 스마트폰 예시는 ‘상품기획의 역설’을 잘 드러낸다. 즉 혁신적인 비정렬 특성(3D 터치, 방수, 프렌즈 등)보다는 정렬 가능한 특성(디자인, 화소, 액정 크기 등)이 소비자의 구매 의사결정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이 현상을 상품기획의 역설이라 한다.
다시 말해 상품 기획자는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치열한 고민 끝에 차별화되고 혁신적인 기능을 추가해 상품을 시장에 내놓는다. 그렇지만 상품기획자의 바람과는 다르게, 소비자는 비정렬 특성보다 정렬 가능한 특성이 구매 의사결정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
| (1995년 출시된 비디오 게임기 ‘닌텐도 버추얼 보이’는 3D디스플레이라는 혁신적인 기능을 탑재했지만 소비자에게 외면당해 6개월 만에 생산이 중단됐다.) |
비교 가능한 특성이 구매 결정에 큰 영향
이런 상품기획의 역설 현상에 대해 소비자 행동, 의사결정, 마케팅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연구를 진행했다. UCLA의 장(Zhang) 교수와 피츠시몬스(Fitzsimons) 교수는 1999년 논문에서 상품을 선택할 때 정렬 특성이 비정렬 특성보다 선호 받는 이유를 설명했다.
소비자는 선택지 안에 있는 상품들의 장단점을 비교해 구매 의사를 결정하는 상황에서 한 상품에만 존재하는 비정렬 특성을 정보로서 가치가 적다고 느낀다. 따라서 상품 구매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진하고 싶지 않은 소비자는 정보 가치가 더 크며, 여러 특성의 가치를 비교하기 쉬운 정렬 가능한 특성을 근거로 구매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다시 스마트폰 구매의 예시로 돌아가 보자. 3D 터치 기능과 방수 기능을 비교한다면, 두 가지 특성은 대응되는 기능이 아니므로 각 특성을 개별적으로 가치 평가를 한 후에 비교해야 한다. 그렇게 하더라도 개인별로 다를 뿐더러 자신의 판단에 확신을 하기 어렵다.
>>>
소비자는 한 상품에만 존재하는
비정렬 특성의 정보 가치가 적다고 느낀다.
상품 구매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고 싶지 않은 소비자는
정보 가치가 더 크며 비교하기 쉬운 정렬 가능한 특성을 근거로
구매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반면, 정렬 가능한 특성은 같은 기준 상에서 상품의 특성을 비교할 수 있어 상대적인 비교가 쉽다. 예를 들면 1200만 화소의 카메라보다는 1600만 화소의 카메라가 더 좋다는 것이나 배터리의 용량이 2800㎃h보다는 3600㎃h가 같은 조건에서 더 오래 가기 때문에 더 좋다는 사실에 대부분의 사람이 동의할 수 있다. 따라서 상품 간의 차이를 명확히 비교하거나 무엇이 좋은지 판단하기 쉽다.
이 현상을 마케팅 분야의 확산이론(diffusion theory)과도 연관해 살펴보자. 확산 이론의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상품군의 사전지식이다. 소비자들은 기존의 상품과 새로운 상품을 비교한다.
그러나 벤더빌트대학의 심리학자 노빅(Novick) 교수의 연구에 의하면, 초보자에 속하는 소비자의 경우 상품의 기능보다는 특징을 갖고 비교한다. 이런 소비자에게 비정렬 특성을 중심으로 광고하면 상품을 비교하거나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결과적으로 혁신적인 비정렬 특성이 상품에 추가돼도 정렬 가능한 특성을 기준으로 구매 의사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시장에서도 상품의 혁신적인 기능이 외면 받은 사례가 있다. 예를 들어 닌텐도는 1995년 당시 혁신적이었던 3D디스플레이 기능을 추가한 비디오 게임기인 ‘닌텐도 버추얼 보이’를 출시했다. 소니가 1994년에 처음 ‘플레이스테이션1’을 출시한 이후 1년 만에 3D디스플레이라는 혁신적인 기능을 탑재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외면당한 닌텐도 버추얼 보이는 6개월 만에 생산이 중단되며 닌텐도의 가장 단명한 상품이라는 오명을 얻었다.
2012년에 처음 출시된 ‘구글 글래스’도 마찬가지다. 구글 글래스는 안경을 기준으로 보면 카메라, 내비게이션, 날씨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디스플레이라는 비정렬 특성이 추가된 안경이다. 스마트 디바이스를 기준으로 보면 양손이 자유롭고 눈으로 조작이 가능하다는 비정렬 특성이 추가된 스마트 디바이스다. 그렇지만 구글 글래스는 어떤 분야에서도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지 못했다.
| (2012년 출시된 ‘구글 글래스’는 카메라, 내비게이션, 날씨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했지만, 어떤 분야에서도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지 못했다.) |
이런 현상을 실험을 통해 증명한 연구도 있다. 2001년에 앞서 언급한 장 교수와 텍사스 오스틴대학 심리학과 마크만 교수는 2개의 가상 팝콘 상품을 구성했다. 한 상품은 정렬 가능한 특성의 점수가 더 높았으며 다른 상품은 비정렬 특성의 점수가 더 높았지만 두 상품의 통합적 점수에는 차이가 없었다.
그리고 참가자들이 어떤 상품을 더 선호하는지 평가했을 때, 사람들은 정렬 가능한 상품에서 높은 점수를 가진 상품을 선호했다. 소비자는 뛰어난 비정렬 특성을 가진 상품보다는 탁월한 정렬 가능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상품을 고르는 경향이 있다.
그렇다면 혁신은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데 필요가 없는 것일까? 꼭 그렇지는 않다. 상황과 맥락이 변화하면 의사결정이 달라지는 양상을 보였다. 예를 들어 장 교수와 마크만 교수의 연구를 보면 참가자들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정렬 가능한 특성에서 탁월한 상품을 선호했지만, 상황과 맥락이 변화하면 참가자의 의사결정이 달라졌다.
참가자들이 스스로의 답변이 가치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해 실험에 대한 관여도(involvement)를 높여줬을 때, 비정렬 특성 역시 의사결정에 반영하는 모습을 보였다. 관여도 외에도 소비자의 의사결정은 시간의 압박이나 스트레스나 감정 상태, 선택의 다양성, 그리고 매장 내의 사람 밀도 등에도 영향을 받는다.
이와 비슷하게 신상품의 비정렬 특성과 관련해 경험 마케팅이 하나의 솔루션이 될 수 있다. 사용자의 라이프 사이클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신상품을 사용해 볼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해 사용자가 혁신적인 비정렬 특성의 매력이나 중요성을 직접 경험해 본다면 소비자의 구매 의사결정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수상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이 방수 기능을 체험해 본다면 방수 기능이 의사결정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수도 있다. 혹은 음악을 하는 사람이 고음질 스피커 액세서리로 음악을 들어본다면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다.
이처럼 사용자들은 기본적으로 소위 혁신적인 특성이라고 하는 비정렬 특성보다는 정렬 가능한 특성을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혁신을 기획할 때는 특정 기능의 혁신성과 더불어 맥락과 경험을 포함한 사용자의 심리를 고려한 전략적 접근을 고민해봐야 한다.
<본 기사는 테크M 제40호(2016년8월) 기사입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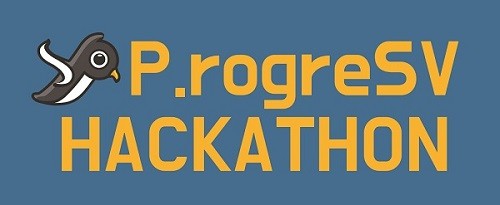 서울대 기술지주, 기업가 정신 고취 해커톤 개최서울대 기술지주회사가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서울대 학부생과 대학원생의 기업가 정신을 고취하고 네트워킹을 독려하기 위한 해커톤 ‘프로그래시브 해커톤(P.rogreSV Hackathon)’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프로그래시브 해커톤은 서울대학교 기술지주회사, 산학협력단, 벤처경영기업가센터가 공동 주최하고, 서울대 창업동아리 ‘에스엔유에스브이(SNUSV.NET)’와 기초 코딩 동아리 ‘프로그래밍(P.rogramming)’이 함께 운영한다. 이번 해커톤은 서울대 학부생, 대학원생, 2015년 창업 맞춤형2016-08-16 12:10:01도강호 기자
서울대 기술지주, 기업가 정신 고취 해커톤 개최서울대 기술지주회사가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서울대 학부생과 대학원생의 기업가 정신을 고취하고 네트워킹을 독려하기 위한 해커톤 ‘프로그래시브 해커톤(P.rogreSV Hackathon)’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프로그래시브 해커톤은 서울대학교 기술지주회사, 산학협력단, 벤처경영기업가센터가 공동 주최하고, 서울대 창업동아리 ‘에스엔유에스브이(SNUSV.NET)’와 기초 코딩 동아리 ‘프로그래밍(P.rogramming)’이 함께 운영한다. 이번 해커톤은 서울대 학부생, 대학원생, 2015년 창업 맞춤형2016-08-16 12:10:01도강호 기자 -
 [이슈 브리핑] 안보, 세금, 역차별까지…지도 데이터 반출 논란 결론은?증강현실(AR) 게임 ‘포켓몬고’ 인기로 촉발된 구글의 한국 지도 데이터 반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혁신을 위해 반출이 허용돼야 한다는 구글의 주장과 안보문제, 세금회피문제, 타 기업과 형평성 문제 등을 주장하는 반대 측의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12일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던 국토교통부도 협의체 회의를 연기한 후 고심하고 있다. 당분간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포켓몬고 열풍이 구글 지도 논란으로2016-08-16 01:40:03강진규 기자
[이슈 브리핑] 안보, 세금, 역차별까지…지도 데이터 반출 논란 결론은?증강현실(AR) 게임 ‘포켓몬고’ 인기로 촉발된 구글의 한국 지도 데이터 반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혁신을 위해 반출이 허용돼야 한다는 구글의 주장과 안보문제, 세금회피문제, 타 기업과 형평성 문제 등을 주장하는 반대 측의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12일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던 국토교통부도 협의체 회의를 연기한 후 고심하고 있다. 당분간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포켓몬고 열풍이 구글 지도 논란으로2016-08-16 01:40:03강진규 기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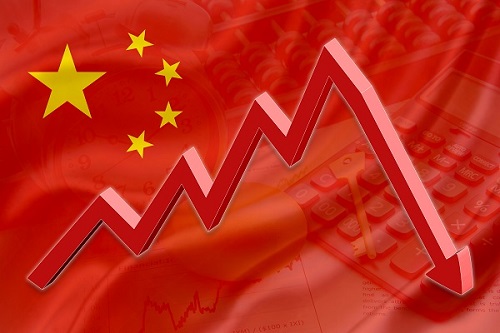 [이슈 브리핑] 대중국 ICT 수출 감소 8개월째…반전 쉽지 않다[테크M = 취재팀] 우리 정보통신기술(ICT)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 수출의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ICT 수출 전체에도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다. 산업자원부와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지난 7월 중국(홍콩 포함) ICT 수출액은 67억4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9.5% 감소했다. 이로써 대중국 ICT 수출은 8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 [자료: 산업통상자원부]대중국2016-08-16 01:40:01테크M 취재팀
[이슈 브리핑] 대중국 ICT 수출 감소 8개월째…반전 쉽지 않다[테크M = 취재팀] 우리 정보통신기술(ICT)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 수출의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ICT 수출 전체에도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다. 산업자원부와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지난 7월 중국(홍콩 포함) ICT 수출액은 67억4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9.5% 감소했다. 이로써 대중국 ICT 수출은 8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 [자료: 산업통상자원부]대중국2016-08-16 01:40:01테크M 취재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