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CH M
TECH M
한국 토대로 아시아인 표준 유전체 지도 만들 것

| (서정선 교수는 가장 공백이 적은 인간 유전체 지도를 제작했다.) |
안젤리나 졸리는 2013년 암 예방을 위해 유방절제술을 받은 데 이어 2015년에는 난소난관절제술을 받았다. BRCA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BRCA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있을 경우 유방암과 난소암에 걸릴 확률이 돌연변이가 없는 사람에 비해 10배 이상 높다.
안젤리나 졸리의 사례는 인간 유전체 분석이 질병 예방과 치료에 가져올 수 있는 변화를 보여준다. 유전체 분석은 개인의 유전적 특성에 따라 치료하는 정밀의학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특히 정밀의학은 유전자 변이와 질병의 관계를 파악하고 개인의 유전자 변이를 분석해 개인별로 치료효과를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의료비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정밀의학은 ‘표준 유전체 지도’를 만드는 것에서 시작된다. 표준 유전체 지도는 질병과 관련된 유전자를 찾고, 개인 유전자의 변이를 파악하기 위한 기준이 된다. 표준 유전체 지도를 만들기 위한 최초의 시도는 2001년 초안을 발표하고, 2003년 완료된 인간게놈프로젝트다. 이후 유전자 분석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유전체 정보를 해독하는 다양한 시도가 이뤄졌다.
가장 정밀한 인간 유전체 지도 제작
10월 서정선 교수가 이끄는 서울대 의과대학 유전체의학연구소는 한국인 표준 유전체 지도에 대한 연구결과를 네이처에 게재했다. 이번 연구의 큰 성과는 지금까지 발표된 연구 가운데 공백이 가장 적은, 가장 정밀한 유전체 지도를 만들었다는 점이다. 서 교수는 “표준 지도에서 비어있던 190곳의 DNA 영역 가운데 177곳의 정보를 메웠다”고 설명했다.
서 교수는 이번 연구를 위해 신생조합 방식과 백(BAC) 클론 기법을 사용했다. 유전체 분석은 유전자를 잘게 잘라 염기서열을 분석한 다음 이를 다시 순서대로 나열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한 번에 분석할 수 있는 유전자의 길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유전자를 자른 후 다시 연결하는 번거로운 방법을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유전체 분석 연구에서는 자른 유전자를 다시 나열하기 위해 미국 국립생물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표준 유전체 지도인 ‘GRCh38’을 사용한다. 이를 통해 유전체 분석 연구의 과학적 신뢰성과 호환성을 확보할 수 있다.
문제는 GRCh38에 공백이 있다는 점이다. 유전자를 나열할 때 공백에 해당하는 부분은 유전체 정보가 소실된다. 게다가 GRCh38은 서양인을 기준으로 제작돼 서양인과 아시아인 사이에 차이가 있는 부분의 유전체 정보도 나열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GRCh38을 이용한 아시아인의 유전체 분석에서는 공백이 많은 불완전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
서 교수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GRCh38을 사용하지 않고 잘린 유전자의 앞뒤 내용을 일일이 확인해 연결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서 교수는 “같은 신문 여러 개를 파쇄한 다음 내용을 보며 다시 배치하는 것과 같다”고 비유했다. 이때 백 클론 기법을 이용해 잘린 염기들의 염기서열 위치를 파악해 잘린 유전자가 제대로 연결됐는지 검증했다.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10년 무렵부터 같은 방법으로 정밀한 아시아인의 표준 유전체 지도를 만들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실패했다. 당시 유전자 분석기술로는 유전자를 150 염기쌍 길이로 짧게 잘라 읽어야 했다. 이렇게 할 경우 너무 많은 유전자 조각이 나와 이를 다시 조합하는 데만 4년이 걸린다.
분위기가 반전된 것은 2014년이다. 유전자를 1만5000 염기쌍 길이로 잘라 읽을 수 있는 방법이 나온 것이다. 이 방법을 이용하면 유전체 분석에 걸리는 시간도 3개월로 줄어든다.
| (원형으로 그리 서정선 교수 연구진의 유전체 연구 결과) |
정밀의학 위해 유전체 변이 정보 확보해야
이번 연구에서는 한국인의 유전체가 1만8000개 구역에서 표준 유전체 지도와는 다른 변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중 1만 개 변이는 표준 유전체에는 없는 전혀 새로운 것이었다. 이는 유전체를 바탕으로 한 정밀의학에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서 교수는 “항암제 가운데 아시아인에게 잘 안 맞는 약물이 있는데 유전자의 차이가 원인인 경우가 있었다”며 “정밀의학을 위해서는 유전체 변이에 대한 정보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 교수는 “미래에는 노인 인구의 증가로 현재와 같은 방식의 의료로는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며 “개인 맞춤형 정밀의학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다.
서 교수는 또 “머지않아 중국 인구의 50%가 65세 이상이 될 것”이라며 “현재는 의료비의 90%가 미국, 유럽, 일본에 집중돼 있지만 10년만 지나면 주요 의약품 시장은 아시아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만큼 제약회사들에게 아시아인의 유전체 특이성 정보가 중요해 진다는 것이다.
서 교수는 내년 말까지 아시아인 1만 명의 유전체를 분석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3년 뒤에는 10만 명의 유전체 정보를 확보할 계획이다.
서 교수는 “10만 명 정도는 돼야 질병과 유전자를 매칭해 의학에 활용할 수 있는 수준이 된다”며 “10만 명의 정보를 확보하면 한국이 아시아 유전체 허브 역할을 하며 앞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테크M = 도강호 기자(gangdogi@techm.kr)]
<본 기사는 테크M 제43호(2016년11월) 기사입니다>
-
 [이슈 브리핑] 트럼프 당선…실리콘밸리는, 그리고 우리는11월 8일(현지시각) 치러진 미국 대선에서 예상을 깨고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됐다. 세계 각국이 트럼프의 당선으로 외교, 국방, 경제 등 각 분야에 미칠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IT 분야 역시 마찬가지다.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지원했던 실리콘밸리의 운명에도 관심이 높다. 트럼프가 한국 IT업계에 끼칠 영향도 주목된다. 트럼프 당선으로 IT업계는 실리콘밸리의 운명에 주목하고 있다. 실리콘밸리의 기업들과 주요 인사들은 대부분 힐러리를 지지했다. 실리콘밸리의 자유로운 성향도 이2016-11-13 20:40:01강진규 기자
[이슈 브리핑] 트럼프 당선…실리콘밸리는, 그리고 우리는11월 8일(현지시각) 치러진 미국 대선에서 예상을 깨고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됐다. 세계 각국이 트럼프의 당선으로 외교, 국방, 경제 등 각 분야에 미칠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IT 분야 역시 마찬가지다.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지원했던 실리콘밸리의 운명에도 관심이 높다. 트럼프가 한국 IT업계에 끼칠 영향도 주목된다. 트럼프 당선으로 IT업계는 실리콘밸리의 운명에 주목하고 있다. 실리콘밸리의 기업들과 주요 인사들은 대부분 힐러리를 지지했다. 실리콘밸리의 자유로운 성향도 이2016-11-13 20:40:01강진규 기자 -
 “AI·로봇의 위협은 없다. 하기 싫은 일 대신할 뿐”“컴퓨터(AI)가 인간의 수준을 따라잡는 것은 500년 후에나 가능할지 모르겠다. 인공지능(AI)과 로봇에 대한 우려는 과장됐다. 영화를 많이 봐서 그런 것 같다.”로봇의 아버지, 로봇의 대가, 로봇의 그루. 로드니 브룩스 리씽크로보틱스 회장 겸 최고기술책임자(CTO)에게 사람들이 붙이는 수식어들이다.MIT 인공지능연구소장을 맡으면서 제자들과 함께 획기적인 연구 성과를 내놓은 것은 물론 그 자신과 제자들이 로봇 산업계에 직접 뛰어들어 그 영향력은 다른 누구도 넘기 어렵다.2016-11-13 12:10:03강동식 기자
“AI·로봇의 위협은 없다. 하기 싫은 일 대신할 뿐”“컴퓨터(AI)가 인간의 수준을 따라잡는 것은 500년 후에나 가능할지 모르겠다. 인공지능(AI)과 로봇에 대한 우려는 과장됐다. 영화를 많이 봐서 그런 것 같다.”로봇의 아버지, 로봇의 대가, 로봇의 그루. 로드니 브룩스 리씽크로보틱스 회장 겸 최고기술책임자(CTO)에게 사람들이 붙이는 수식어들이다.MIT 인공지능연구소장을 맡으면서 제자들과 함께 획기적인 연구 성과를 내놓은 것은 물론 그 자신과 제자들이 로봇 산업계에 직접 뛰어들어 그 영향력은 다른 누구도 넘기 어렵다.2016-11-13 12:10:03강동식 기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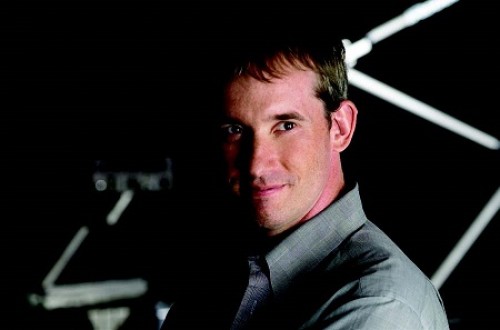 로봇의 지평 넓힌 로드니 브룩스와 그의 사단로봇 분야에서 로드니 브룩스만큼 오랜 기간 지대한 영향력을 끼친 인물은 없다. 오랜 기간의 연구를 통해 기존의 통념을 깨는 이론적 성과를 거둔 것과 함께 이론 연구에 그치지 않고 제자들과 함께 직접 시장에 뛰어들어 로봇의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입증, 로봇 산업 발전에 이바지했기 때문이다.1954년 오스트레일리아에서 태어난 로드니 브룩스는 열두 살 때 처음 로봇을 만들었다. 그는 스탠퍼드대에서 컴퓨터공학 박사학위를 받은 뒤 2010년까지 MIT에서 로봇공학 교수와 MIT 인공지능연구소장을 맡아 로봇과 관련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했다2016-11-13 11:40:01강동식 기자
로봇의 지평 넓힌 로드니 브룩스와 그의 사단로봇 분야에서 로드니 브룩스만큼 오랜 기간 지대한 영향력을 끼친 인물은 없다. 오랜 기간의 연구를 통해 기존의 통념을 깨는 이론적 성과를 거둔 것과 함께 이론 연구에 그치지 않고 제자들과 함께 직접 시장에 뛰어들어 로봇의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입증, 로봇 산업 발전에 이바지했기 때문이다.1954년 오스트레일리아에서 태어난 로드니 브룩스는 열두 살 때 처음 로봇을 만들었다. 그는 스탠퍼드대에서 컴퓨터공학 박사학위를 받은 뒤 2010년까지 MIT에서 로봇공학 교수와 MIT 인공지능연구소장을 맡아 로봇과 관련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했다2016-11-13 11:40:01강동식 기자






